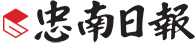[충남일보 김현수 기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지질자원연)이 국회환경포럼, (사)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와 함께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하수 오염 전주기 관리와 정화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정부, 산업계, 학계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해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지하수 오염 대응과 과학적 정화 전략,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지하수는 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활용되는 핵심 수자원으로, 가뭄 시 물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한 번 오염되면 피해가 서서히 나타나고 자연 정화에도 오랜 시간이 걸려 복원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
최근 산업단지와 제련소 등에서 염소계 유기용매(TCE)와 중금속 오염 사례가 늘고 있다. TCE는 금속 세척 등에 쓰이는 대표적 산업용 용제이자 발암물질로 비수용성 고밀도 액상 오염물질(DNAPL) 특성을 지녀 지하 암반 틈새에 깊숙이 침투해 장기 잔류하는 특성이 있다. 물에 뜨는 일반 오염과 달리 발견과 정화가 어려워 지하 환경의 잠복 오염원으로 지목된다.
지질자원연 문희선 지하수환경연구센터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TCE 및 중금속 오염부지에 대한 평가 기술과 정화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연구진은 물리탐사와 검층조사를 통해 산업단지 주변 TCE 오염 특성을 분석하고 3차원 지질·암상 기반의 오염 분포 모델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정화 비용 절감과 환경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자연저감(MNA)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으며, 오염 저감에 관여하는 미생물 생태 특성도 확인했다.
문 센터장은 “지하수 오염의 근본 해결을 위해 사전 조사부터 정화 완료 이후의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관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며 “수리지질 개념모델(CSM)을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정화 이후에도 장기관리(LTS) 제도를 도입해 모니터링과 정보 공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이강근 교수는 “현행 생활용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부지 특성에 맞는 적응형 정화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며 “오염원인자 규명이 어려운 경우 정화 기금을 활용해 위해성이 높은 지역부터 공공 정화를 우선 추진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환경공단 김락현 부장은 “DNAPL 오염은 토양 오염이 인지되기 전 지하수에서 먼저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며 “지자체의 사후조치 행정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 및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최광준 단장은 “토양 오염원을 제거하지 않으면 지하수 정화 이후에도 재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오염원 특정이 어려운 산업단지 현실을 고려해 국가 차원의 정화 추진과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이균 지질자원연 원장은 “지하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탱하고, 산업과 생태계, 지역 균형발전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보이지 않는 기반 자원”이라며 “국회와 정부, 산학연 협력을 통해 지하수 오염 정화와 관리 정책의 미래를 여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