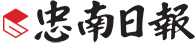[충남일보 이연지 기자] 새 정부가 고령사회 대응 전략의 하나로 정년 연장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65세 정년 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4년 합계출산율(0.75명)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경우도 2019년(3763만 명) 이래 감소세로,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상 2039년에는 3000만 명선이 무너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올해 첫 1000만 명대를 돌파했고, 그 비중은 2036년 30%, 2050년 40%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정년 연장을 위한 법 개정 검토가 시작됐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도 임금 체계 개편과 연계 여부를 두고 의견차가 존재한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정년 연장은 단순한 연령 조정이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개편 문제"라며 "직무·성과 중심 임금 체계로의 전환과 함께 추진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도 정년 연장이 시대적 과제라며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하고 있다.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60세 정년이 유지되면 베이비붐 세대는 국민연금 수급 시기까지 소득 공백을 겪게 되는 만큼, 노후 빈곤과 복지 지출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청년층 고용 감소 가능성과 세대 간 갈등 심화를 우려하는 입장이다. 정년을 늘리더라도 노후 안정으로 직결되지 않을뿐더러 신규 채용 축소, 임금 피크제 확대, 중장년 간 경쟁 심화 등 부작용을 먼저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인 단체에서도 법정 정년 연장 반대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현행 만 60세 정년제는 2017년 전면 시행됐지만 고령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기보다는 신규채용 위축, 조기퇴직 확대, 인사적체 심화 등 부정적 영향만 심화시켰다"며 "높은 임금 연공성과 고용 경직성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법정 정년을 연장한다면 동일한 부작용이 반복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청년층 등을 중심으로 반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대전에 거주하는 김 모 씨(30)는 "저출생과 인구 위기 대응을 정년 연장의 이유로 제시하지만, 사실상 청년 고용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며 "우선적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 대책부터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 논의가 '연령 상향' 논란에 머무르면 실패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교수는 "정년 문제는 연금개혁, 평생학습, 직업 전환 지원, 청년 고용 전략과 모두 연결돼 있다"며 "세대 간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를 만드는 방향의 종합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같이 정년 연장 법제화가 현실화될지는 국회 논의와 사회적 합의 속도에 달려 있다.
당장 결론이 쉽게 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도 고령화가 심화되는 현실 속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부상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