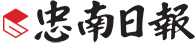![[글·사진=연합뉴스]](https://cdn.chungnamilbo.co.kr/news/photo/202511/858018_437936_4528.jpg)
20세기 초반 예술계의 성좌를 차지한 건 늘 찬밥신세였던 무용이었다. 이사도라 덩컨, 바츨라프 니진스키 등 천재적인 무용가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오며 전성기를 누렸다. 그러나 덩컨의 어이없는 죽음과 함께 전성기는 짧게 끝났다.
전성기를 끝장낸 건 어이없는 사고였다. 덩컨은 1927년 9월 14일 오후 9시 40분께 자기 키보다 2배나 큰 대형 스카프를 몸에 두르고 컨버터블 차에 오르며 이렇게 외쳤다고 한다.
"안녕, 여러분. 나는 영광을 향해 갑니다!"
차가 출발하자 긴 스카프가 뒷바퀴에 엉키며 덩컨의 목을 조였고, 차는 순식간에 그녀를 내동댕이쳤다. 그 과정에서 덩컨의 목이 부러졌다. 즉사였다.
목이 부러지면 의료진이든 소방대원이든 어떻게 처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심폐소생술도 무용하고, 승압제(혈압상승제)도 쓸모없으며 인공호흡기도 달 수 없다. 그야말로 소생시킬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다. 연약함. 목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다.
인간만 그렇게 연약한 목을 지니고 있는 건 아니다. 동물들도 대부분 그렇다. 호랑이나 사자 등 맹수들은 사냥감의 목을 물어 사냥한다. 신체에서 가장 약한 부분을 물어 숨지게 하는, 가장 효율적인 사살 방법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왜 이처럼 약한 목이 생물사에서 등장했을까.
목이 지구상에 등장한 건 척추동물이 물에서 뭍으로 올라오던 3억7천만년 전으로 추정된다. 생명체가 바닷속에 있을 때는 목이 필요 없었다. 빛이 물을 잘 투과하지 못해 어차피 멀리 볼 수 없었고, 물 속이라 몸을 돌려 방향을 전환하는 데도 용이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감각기능을 담당하는 머리와 운동기능을 담당하는 몸통이 하나로 이어졌다. 바닷속에 사는 어류는 지금도 목이 없다.
생명체가 육지로 올라오자 목이 필요해졌다. 빛은 물과는 달리 공기 중에서 멀리 뻗어나갔다. 먼 곳에 있는 적을 살피거나 더 먼 곳에 있는 먹잇감을 찾기 용이해졌다는 의미였다.
목이 있으면 몸 전체를 움직이지 않고도 넓은 범위를 살펴 멀리 떨어진 먹잇감을 포획할 수 있었다. 가령 독수리는 비행하면서 고개를 숙여 땅 위의 먹이를 탐색할 수 있다.
목은 곧 생명의 중추로 발전해 나갔다. 목에 있는 식도를 통해 음식물을 삼키고, 기도를 통해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몸속을 드나들며 촘촘한 림프샘에서 나온 백혈구들이 외부 세균을 퇴치했다.
최근 출간된 '목 이야기'(시공사)는 30㎝에 불과한 목에 대한 과학사와 문화사를 흥미롭게 살핀 책이다. 캔트 던랩 미국 트리니티칼리지 생물학 교수가 목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를 전한다. 예술과 권력의 역사 속에서 목의 기능과 의미를 분석하고 해부학과 의학지식을 토대로 목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해 나간다.
저자는 목이 단순한 생물학적 구조가 아니라 진화와 감정, 관계와 권력이 교차하는 생명의 현장이라고 말한다. 아울러 삶을 상징하는 강력한 은유라고 강조한다.
"생명의 다양성과 영속성은 영겁의 세월과 수많은 세대를 거치며 이어졌다. 생명체는 태어나고 번식하며, 언젠가는 죽음을 맞는다. 좋든 싫든 인간은 생명력의 강인함과 재생력, 더불어 궁극적인 취약성과 순간성을 인지한 채 세상을 살아간다. 우리가 예술, 종교, 내면세계에서 하는 일 대부분은 이 불가피한 존재의 조건을 받아들이려는 시도다. 이런 의미에서 생명력과 취약성이 집중된 목은 삶을 상징하는 강력한 은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