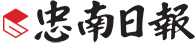더불어민주당이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연내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 6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까지 정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연내에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한 집권 여당과 정부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정년 연장은 확정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하지만 지금의 노동 시장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올해 3분기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5.1%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2%포인트 상승했다. 4분기 모두 연속 악화하고 있다.
잠재 구직자 등을 포함한 체감 청년 실업률은 공식 실업률의 3배가 넘는 15.5%에 달한다. 정년 연장이 안 그래도 최악인 청년 일자리 잠식을 낳는 부작용도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 정년 연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현행 63세에서 65세로 상향됨에 따라 정년 이후 5년에 달하는 소득 공백을 메우자는 취지다.
고령층의 사회적 고립을 최소화하는 측면도 있어 환영 할 일이다. 급속한 고령화에도 역대 정부가 미뤄 놓은 과제인 만큼 현 정부에선 매듭을 짓고 가는 게 마땅하다.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풀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이다. 고용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노동 시장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임금 체계도 손봐야 한다. 획일적 정년 연장 대신 퇴직 후 재 고용을 활성화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봐야 한다. 정년 후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새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면, 인건비 부담을 줄여 청년층 고용 타격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년 연장은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 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
그러나 고용 위축, 노동 시장의 빈익빈 부익부, 기업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큰 만큼 총체적 노동 시장 개혁이라는 보다 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때문에 속도보다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웃 국가들의 전례를 참고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우리보다 10여년 먼저(2013년) 정년을 늘린 일본은 임금 피크제나 재 고용 계약을 통해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의 허들을 뛰어넘었다. 임금은 연공 서열을 버리는 대신 직무와 성과에 따라 대폭 삭감해 재계약을 맺도록 했다. 정년을 늘리는 대신 직책의 변경이나 근로시간의 단축 또는 직무 내용의 변경 같은 현실을 정확히 급여에 반영했다.
때문에 한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정년의 연장은 사회의 총 생산력을 유지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자 60대 국민의 소득 단절을 메워주는 방편이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모든 구성원들이 수용 가능한 임금 체계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