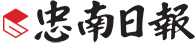[충남일보 이승우 기자] 우리 사회의 결혼과 출산이 지난 30년 동안 더 적고 더 늦게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혼인·출생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출생아는 1995년에는 71만5000명이었으나 2024년에는 33% 수준인 23만8000명으로 줄었다.
아울러 합계출산율은 같은 기간 1.63명에서 0.75명으로 내려 절반 이하가 됐다. 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27.9세에서 33.7세로 5.8세 올랐고 부의 평균 출산 연령도 31.1세에서 36.1세로 높아졌다. OECD 회원국과 비교해 한국은 출산율이 가장 낮고 첫째아 출산 연령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혼인 감소가 출산 축소로 이어지는 구조도 선명하다. 혼인 건수는 1996년 43만5000건을 정점으로 줄어 2022년 19만1700건까지 낮아졌다.
다만 2023년 19만3700건, 2024년 22만2400건으로 2년 연속 소폭 반등해 20만 건을 회복했다.
평균 초혼 연령은 1995년 남자 28.4세·여자 25.3세에서 2024년 남자 33.9세·여자 31.6세로 높아졌고 결혼 후 첫째아를 낳기까지의 기간도 1.5년에서 2.5년으로 늘었다. 결혼 2년 안에 첫째를 낳는 비중은 83.0%에서 52.6%로 30.4p 감소했다.
출산의 연령대와 순위도 달라졌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출산의 중심축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후반으로 이동했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은 4.8%에서 35.9%로 31.2p 늘었다.
더불어 첫째아 비중은 48.4%에서 61.3%로 13.0p 확대된 반면 둘째아 비중은 43.1%에서 31.8%로 11.2p, 셋째아 이상은 8.6%에서 6.8%로 1.8p 줄었다. 다태아 출생아는 9400명에서 1만 3500명으로 증가해 비중이 1.3%에서 5.7%로 4.4p 커졌다.
가족 형태의 다변화도 진행 중이다. 혼인 외 출생아는 8800명에서 1만3800명으로 늘며 비중이 1.2%에서 5.8%로 확대됐다.
또한 외국인과의 혼인은 1만3500건에서 2만800건으로 53.9% 증가했고 전체 혼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4%에서 9.3%로 늘었다.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 간 혼인은 1만400건에서 1만5600건으로,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 간 혼인은 3100건에서 5000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출생의 저점 통과 신호도 일부 관찰된다. 출생아 수는 2023년 23만 명으로 최저를 기록한 뒤 2024년 23만 8000명으로 반등했다. 연령별 출산율을 보면 25∼29세는 낮아졌지만 30∼34세와 35∼39세는 각각 70.4명, 46.0명으로 1995년 대비 높아졌다.
유배우 출산율(배우자가 있는 여성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도 25∼29세 203.5명, 30∼34세 171.5명, 35∼39세 69.1명으로, 2015년 이후 하락했다가 2022년부터 반등 조짐이 확인된다.
종합하면 혼인과 출생은 팬데믹 이후 두 해 연속 소폭 회복했으나 1990년대 중반 대비 장기 하락 추세는 여전히 가팔라져 있다.
결혼·출산 시점의 지연, 첫째아 집중, 고령 출산 확대, 혼인 외 출생 증가, 국제혼 확대가 30년 변화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고 이는 주거·고용·양육비 등 구조적 요인과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가 맞물린 결과로 읽힌다.
반등 신호를 실질적 전환으로 이어가려면 혼인과 출산의 ‘타이밍 리스크’를 줄이는 정책, 둘째 이후 출산을 뒷받침하는 생애주기형 지원,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는 제도 설계가 동시에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통계 한 전문가는 “혼인과 출생이 최근 들어 동반 반등했지만 30년 축적된 구조 변화가 크다”며 “유배우 출산율이 다시 오르는 만큼 결혼 이후의 출산 장애 요인을 줄이고 둘째 이상에 실효성 있는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향후 흐름을 바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