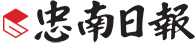충청도 기질을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속내를 쉽게 드러 내질 않는다는 말들을 많이 듣는다. 호불호에 대해 직접적이기 보다는 간접적이거나 우회적인 편이다.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대뜸 나서질 않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에 옮긴다. 그러다 보니 양반소리도 듣지만 속을 알 수 없다거나 소극적이라는 평판도 혼재한다.
그러나 이런 점잖은 충청도 기질을 무색하게 만든 대표적인 사건으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을 꼽을 수 있다. 이 특별법이 대선 공약과 국회 통과에도 불구하고 관습헌법을 잣대로 위헌 판결이 나자 충청권 민심은 들불같이 폭발했다.
충청권의 여야 정치권에서는 단식이 잇따르고 대전과 충남, 충북의 시민・사회단체, 종교・언론・학계, 출향인사까지 가세하며 신행정수도 사수를 촉구했다. 특히 하루가 멀다 하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상경 투쟁을 불사하며 위헌 결정 ‘5적(敵)’에 대한 화형식도 마다 하지 않았다. 충청도의 일반적인 정서로 볼 때 이례적이고 투쟁적이었다. 당시 국회 출입기자 시절, 수도권이나 영호남 등 다른 지역 기자들이 “충청도를 다시 봤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여우 뒤에 호랑이 만나는 격’으로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국회 처리 과정이나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행정기관 이전을 백지화하는 내용의 세종시 수정안 국회 부결 등의 지난한 과정이 연속됐지만 역시 충청권이 하나가 되면서 이를 극복했다.
2020년 3월 충청권의 대표적인 현안이었던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또한 충청권 결집의 산물로 평가된다. 대전과 충남 등 광역단체와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했고 시·도민들이 힘을 모아 혁신도시 유치와 수도권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어떤가? 비근한 사례로 충남을 보면 충남 발전과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 중요한 대선 공약들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당장 문재인 정부 시절 혁신도시라는 ‘그릇’은 만들었지만 ‘내용물’인 수도권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는 오리무중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기약 없이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이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은 예타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국립경찰병원 아산 건립을 비롯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육사 충남(논산) 이전 ▲국립치의학연구소 천안 유치 등은 제동이 걸리거나 반대 여론 등에 부딪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행정의 끝은 정치라는 말이 곧잘 회자된다. 이는 행정과 정치가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반대로 행정과 정치가 겉돌면 현안들이 순조롭게 해결될 리 만무하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고 장단이 맞아야 좋은 노래가 나오는 법이다.
지금의 세종시가 탄생되기 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충청권의 결집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지역민들의 염원과 열망을 토대로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았다. 정당의 지향점이나 이념적 색채는 달랐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머리를 맞댔다. 행정도시 건설을 위해 여의도에서 정례 모임도 갖고 심지어 다른 지역의 충청권 출신 의원들도 초청해 ‘아군’으로 만들었다.
이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민선 8기 충남을 비롯해 충청권에 반면교사가 아닐 수 없다. 광역단체 지휘부가 시정이나 도정의 현안 해결을 위해 노심초사 국회나 정부부처를 오가며 공을 들이고는 있지만 정치권의 협력 없이는 한계가 있다.
현 정부 임기도 반환점을 앞두고 있고 이미 임기 절반을 넘어선 광역단체 장들도 현안 해결을 위해 속도도 내야 하고 서서히 성과도 내야 할 시점이다. 차제에 지자체와 충청권의 여야 정치권간 정례 모임을 구성하는 것도 그 대안이 아닐까 싶다. 이런 자리를 통해 광역단체 장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지역 발전에 힘을 모은다면 시너지 효과는 불문가지(不問可知)다.
관련기사
- [우명균 칼럼] 대선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인가?
- [우명균 칼럼] 민선 8기 충남도 중간 성적표
- [우명균 칼럼] 민생은 등골이 휜다는데...
- [우명균 칼럼] 정치 권력은 안녕하신가?
- [우명균 칼럼] 총선別曲
- [우명균 칼럼] 국회 출입 16년의 단상
- [우명균 칼럼] 원고지와 노트북
- [우명균 칼럼] 희망고문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데자뷰되나?
- [우명균 칼럼] 국정감사 유감(有感)
- [우명균 칼럼] 세종시 소고(小考)
- [우명균 칼럼] 2024년 12월 3일 여의도의 밤
- [우명균 칼럼] 대통령 잔혹사
- [우명균 칼럼] 권력의 늪
- [우명균 칼럼] 소설 광장(廣場)이 소환된 이유
- [우명균 칼럼] 21대 대선 유권자 시점
- [우명균 칼럼] 새 정부에 바란다
- [우명균 칼럼] 행정수도 완성을 논하려면
- [우명균 칼럼] 양치기 소년과 공공기관 이전
- [우명균 칼럼] 호랑이 그리려다 고양이 그리는 예타(예비 타당성 조사)
- [우명균 칼럼] 국감 중간 성적표
- [우명균 칼럼] 내포신도시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